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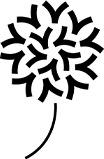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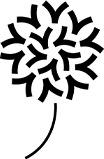
“기상청보다 절기가 더 정확해”라거나
“왜 입춘이 지났는데도 추워?” 이런
말들을 계절이 변할 때 종종 들을 수 있다.
이런 절기는 달력에서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것이다. 절기가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첨단 과학이 적용된 기상청의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출처. <생활 속 24절기> 김고운매 저 , 과학동아북스 출판
<12달 명절과 24절기> 원시인 저, 파란하늘 출판
''복날'은 왜 절기에 끼이지 못했을까?' 홍성호, 한국경제, 2022.08.17.
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 국가유산청,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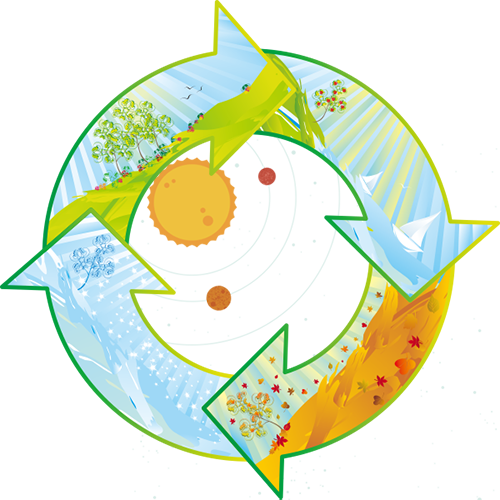
절기는 태양이 1년 동안 지구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궤적인 ‘황도’를 기준으로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기준점이다. 황도는 태양이 지구를 지나가는 경로로 이해하면 쉽다. 이 태양길을 24개로 나뉘어 계절 변화의 기준으로 삼았다. 1년은 365일이기에 대략 보름마다 하나의 절기가 생긴다. 즉, 한 달에 두 번씩 절기가 있는 셈이다. 과거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절기가 농경의례와 연결되었다. 그래서 절기의 명칭은 주로 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반영한 것이 많다.
절기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주나라 시절, 화북지역인 황허강 주변의 기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이 절기는 이후 우리나라에 전해져 사용했는데, 황허강은 현재의 베이징시, 허베이, 톈진, 내몽고자치구에 해당되는 곳이라, 우리와 지리적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일부 절기는 우리나라 기후와는 약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절기 중 ‘대한’이 가장 추운 절기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소한’이 더 춥다. 이런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천체 움직임과 위치에 맞춰 <칠정산>을 편찬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 24절기를 이에 맞춰 조정했다. 그로 인해 절기의 한자 해석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을 가장 추운 날이라 해석하지 않고 겨울을 매듭짓는 절기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속담에도 담겨 있다. 한 예로, ‘대한’보다 작은 추위인 ‘소한’이 더 춥다는 의미에서 ‘대한이 소한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는 속담이 전해진다.
예로부터 절기를 사용했기에 절기의 기준을 음력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절기는 양력이 기준이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초기부터 음력이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양력은 19세기 말 정도에 들어왔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용하는 음력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은 정확히 말하자면 태음태양력이다. 태음태양력은 중국에서 시작되어, 별과 태양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계절의 변화를 관찰했다. 즉, 태양의 변화와 관련된 태음태양력을 이용해 절기를 정한 것이다. 동지는 낮이 가장 짧은 날, 하지는 가장 긴 날을 기준으로 삼고, 이들 사이의 날짜를 반으로 나눠 춘분과 추분으로 삼았다. 다시 그사이를 같은 길이로 나뉘어서 24절기를 만들었다. 이 날짜들은 서양의 태양력과 일치한다.
초복, 중복, 말복인 삼복은 절기가 아닌 속절이다. 삼복은 한여름의 더위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중국의 진·한나라 시절부터 시작된 속절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졌다. 삼복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매년 여름, 이듬해 24절기와 함께 발표되는데 절기에 따라 삼복 날짜도 정해진다. 삼복은 하지 이후 세 번째 경일을 초복, 네 번째 경일을 중복, 입추 후 첫 번째 경일을 말복이라 한다. 여기서 경일(庚日)은 십간(十干)인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에서 ‘경’을 의미하는데, 같은 날이 돌아오는 주기가 10일이기에 초복과 중복은 열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중복과 말복은 입추에 따라 달라지므로 꼭 10일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