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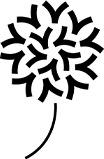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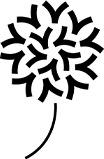
클래식 음악이 요즘 2030 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표한 ‘2024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클래식은
대중음악과 뮤지컬에 이어 티켓 파워 3위를
기록하며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빠른 템포와 숏폼 콘텐츠가 일상이 된 시대에 오히려
느리고 깊은 울림을 지닌 클래식 음악이 ‘희소한 취향’으로
떠오르며 새로운 감성 소비의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출처.
<클래식이 이토록 가까울 줄이야>
문수미 저 | 시대인
<클래식 가이드> 세실리아 저 | 동락


사전에서는 ‘서양의 전통적 작곡 기법이나 연주법에 의한 음악이며, 흔히 대중음악에 상대되는 말’이라 정의한다. 클래식 음악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넓게는 중세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서양의 전통 예술 음악 전반을 포괄하며, 좁게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유럽에서 유행한 고전주의
음악을 뜻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등이 있다.
그렇다면 왜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을 ‘클래식’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고전주의 이전의 음악은 주로 귀족들의 오락 수단에 머물렀지만, 고전주의 음악부터는 형식미와 구조, 이성적 균형을 갖춘 예술로 자리매김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음악을 기준점 삼아 ‘고전(Classic)’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클래식’ 하면 자연스레 음악을 떠올리지만, 영어권에서는 ‘클래시컬 뮤직(Classical Music)’이라고 정확히 표현해야 통한다. ‘클래식’이라는 단어는 ‘명작’, ‘전형적인’, ‘최고 수준의’라는 의미가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다. 외국인과의 대화에서는 ‘클래시컬 뮤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한국인이 좋아하는 클래식 곡 중에는 비발디의 사계가 있다. 이 곡 중 여름의 원제를 살펴보면 ‘Vivaldi: The Four Seasons, Concerto No. 2 in G Minor, Op. 8, RV 315, ‘L’estate’: III. Presto’로, 다소 길고 복잡하다. 어려워 보이는 원제를
이해하면 곡에 대한 이해도도 함께 깊어진다. 하나씩 풀어보면, ‘비발디: 사계 중 협주곡 2번, G단조, 작품번호 8번, 비발디번호 315번, 여름: 3악장 매우 빠르게’라는 의미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비발디가 작곡한 사계 중 두 번째 협주곡으로, 어두운 느낌의 단조(G minor) 중 여덟 번째
작품이며, 그의 작품 중에서는 315번째로 출판된 곡이다. 특히 3악장은 매우 빠르게 연주된다’라는 뜻이다.
클래식 음악 제목은 보통 ‘작곡가, 곡의 장르, 장르별 순서, 조성, 작품번호, 부제, 악장 구분, 빠르기말’ 순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작품번호’는 작곡가별로 고유한 체계를 사용하는데, 비발디는 RV, 베토벤은 WoO., 모차르트는 K 또는 KV로 표기한다.
이처럼 원제를 해석할 수 있다면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곡의 구조와 감정선, 전개 방식까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
연주자들이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는 모습을 보고 관객도 격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정장을 입을 필요는 없다.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이면 충분하다. 공연이 시작된 후에는 연주 중 입장하거나 퇴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연주가 시작된 후에 도착했다면 곡이 끝날 때까지 입구에서 대기한 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조용히 입장하면 된다. 관람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배려다. 오페라에서는 무대가 끝난 뒤 관객이 ‘브라보!’를 외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브라보(Bravo)’는 이탈리아어로 ‘잘한다. 좋다’는 뜻으로, 남성 독창에 대한 찬사다. 여성 독창에는 ‘브라바(Brava)’, 남녀 혼성이나 남성 중창에는 ‘브라비(Bravi)’, 여성 중창에는 ‘브라베(Brave)’를 사용한다. 정확한 표현을 알고 있으면 공연 관람의 품격도 한층 높아진다.
클래식 음악은 크게 기악곡과 성악곡으로 구분된다. 기악곡은 악기만으로 연주되는 음악으로, 대표적인 형식에는 소나타, 교향곡, 협주곡, 즉흥곡, 녹턴 등이 있다. 소나타는 피아노와 같은 독주 악기를 위한 곡으로, 고전주의 시대에 정형화된 구조를 갖췄다. 교향곡은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지는 오케스트라를 위한
대규모 작품으로, 웅장하고 복합적인 음악 세계를 보여준다. 협주곡은 하나의 독주 악기와 오케스트라가 주고받으며 연주하는 형식으로, 독주자와 앙상블이 협력하거나 때론 경쟁하듯 연주한다. 즉흥곡은 낭만주의 시대에 유행한 피아노곡으로, 이름과 달리 정해진 형식 속에서 자유로운 느낌을 표현한다. 녹턴은
‘야상곡’이라는 뜻인데 밤의 정서를 담아 서정적이고 느린 템포로 깊은 감성을 전한다.
성악곡은 가사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음악이다. 오페라, 칸타타, 아리아, 레퀴엠 등이 성악곡에 속한다. 오페라는 모든 대사를 노래로 표현하며, 연기와 의상,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이다. 칸타타는 독창과 중창, 합창이 악기 반주와 함께 어우러지는 형식의 성악곡으로, 종교적이거나
서사적인 내용을 담는다. 아리아는 오페라나 칸타타 속에서 등장하는 독창곡으로, 등장인물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레퀴엠은 고인을 추모하는 가톨릭 미사 음악으로, 장엄하고 깊은 울림을 통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